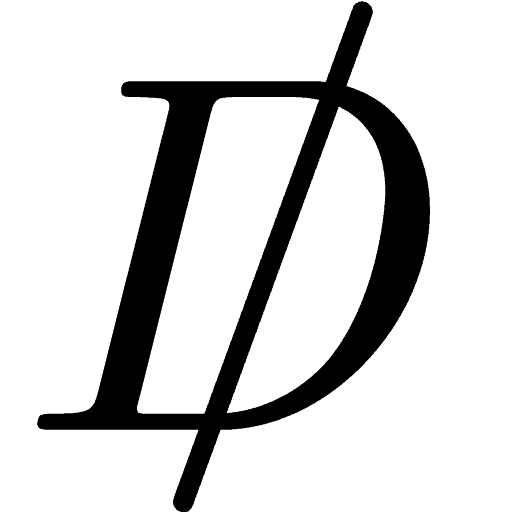유병율(prevalence) 즉 사회에 바이러스가 퍼진 정도가 낮을 때는 확진자수의 대다수가 위양성(false-positive)일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수 즉 PCR 검사 결과와 임상을 함께 고려하여 “확진”을 하여야 한다.
코로나 검사에 활용되는 PCR 검사의 장단점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PCR 검사이다. 여기서 PCR이란 특정 유전자 조각을 복제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다량의 복제물을 얻는 기술을 가리킨다. 복제 과정을 “싸이클”(cycle)이라고 부르다. 싸이클이 반복 횟수(count)를 통상 “Ct 값”이라고 부르는데, Ct 값이 늘어날수록 복제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PCR 기술을 유전자 “증폭” 기술이라고도 한다.
마치 집안에 들어온 도둑의 지문 일부를 채취하여 선명하게 확대시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증폭 기술이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데 유용하다. 왜냐하면 작은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코로나에 감염 되었다면 인후부위에 코로나의 유전물질을 소량이라도 채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채취된 물질에서 특정 유전자 조각을 PCR 기술을 활용하여 [1] 증폭시켜 쉽게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채취된 유전물질이 많다면 적은 Ct 값으로도 (증폭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아도) 검출이 되겠지만, 애초에 채취된 유전물질이 적다면 높은 Ct 값에 이르러야 (증폭을 많이 시켜야) 검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검출을 위한 Ct 값이 높다는 것은 채취된 유전물질이 적었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검사 대상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점으로부터 검사 받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꽤 흘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PCR 검사를 할 때는 검출을 위한 Ct 값을 갖고 판정을 한다. 물론 여기에는 모두에게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은 없다.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Ct = 30 에서 판정을 할 경우 진짜 감염자의 75%가 검출이 되어 양성 판정을 받고, Ct = 40 에서 판정하면 진짜 감염자는 거의 다 검출이 되어 양성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Ct = 40에서 판정하면 양성 판정자의 상당 비율은 이미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이겨서 더 이상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바로 여기에서 PCR 검사 양성 결과의 맹점이 있다. 양성이 나왔지만, 면역체계가 이미 바이러스를 물리쳐 병을 앓지 않고 지나간지 몇 주가 지나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즉, PCR 검사는 어디까지나 바이러스의 흔적을 감지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바이러스에 의해 병을 앓고 있는지, 즉 증상이 있는지, 증상이 있다면 얼마나 심한지, 또 전파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지는 못한다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위에서 사용한 도둑의 지문을 예를 계속 사용하자면, 도둑의 지문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언제 도둑이 들어왔는지, 아직 도둑이 있는지, 도둑이 물건을 얼마나 훔쳤는지 등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유행병의 심각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망자 집계나 위중증입원자 집계가 적절하다. 아래 그림1에서 보듯이, 사망자 집계와 PCR 양성자 집계 사이에는 상관도가 낮다.

PCR 검사의 효용: 위양성, 위음성, 그리고 PPV
두말할 필요 없이 PCR검사의 정확도는 100%가 아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도 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위음성(가짜 음성, false positive)의 경우이다. 감염이 안 되었거나 혹은 더 이상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위양성(가짜 양상, false-positive)의 경우이다. 위양성과 위음성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 두 경우를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공: 경향신문
위양성과 위음성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PCR 검사의 효용이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 효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PCR 검사만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
PCR 검사의 효용을 가늠하기 위한 수치로 PPV(양성예측도)가 있다. 이는 양성결과 중 위양성(가짜양성)이 아닌 진양성의 비율을 말한다. 당연한 예기지만, PPV가 낮으면 낮을 수록 그 진단시험의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
PCR 검사의 효용을 가늠해주는 PPV가 곤두박칠 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은 전체 인구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비율 즉 유병율(prevalence)이 낮을 때이다. 이것은 PPV를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설명을 하기 이전에 아래 그림 3을 예시로 제시한다.

그럼 PPV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병율(IR), 위양성율 (FPR), 그리고 위음성율(FNR)이다. 식으로는 다음과 같다:
\[ \mathrm{PPV} = \frac{ \mathrm{IR}\times(1-\mathrm{FNR})}{\mathrm{IR}\times(1-\mathrm{FNR}) + \mathrm{IR}\times \mathrm{FPR}}. \]
한국에서의 PPV는 어떤가? 정확한 수치들은 알 수 없지만, 2021년 6월 30일 현재 일주일 평균 검사자 대비 양성결과 수로 IR을 대치하면 약 2.5%이다. FPR과 FNR의 경우 조사된 바에 의하면 검사기 종류와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중간값의 경우 FPR=2.3%, FNR=11%다 [2] [3]. 중간값을 갖고 계산한 PPV는 50% (최악의 경우엔 4%) 가까이 떨어진다. 달리 말하자면, 소위 “확진자”라고 불리는 PCR 검사의 양성자 절반이 (최악의 경우엔 거의 대부분) 위양성일 수 있다. “확진자”가 600명이 나오면 300명, 최악의 경우 거의 600명 전부가 불필요한 자가격리와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제언
이상에서 보았듯이, PCR 검사는 바이러스가 검사자의 몸에 들어온 흔적을 증폭시켜 보는 것이기에, 언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증상이 있는지, 증상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게다가 낮은 유병율에서는 PPV가 너무 낮아 양성자의 대다수가 위양성자일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PCR 양성 결과 만으로 “확진”을 논하지 말고 임상(증상)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확진”을 하여야 한다. 기억할 것은 독감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같은 유행성 감기의 경우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율이 통계적으로 0%라는 점이다. 그리고 정부와 언론은 PCR 검사 결과만 사용한 지금의 확진자 통계를 갖고 불안조성 하는 일을 반성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
End Notes
- 여기에는 역전사 기술이 더해진다. ↩
- I. Arevalo-Rodriguez et al. (2020) False-negative results of initial RT-PCR assays for COVID-19: A systematic review. PLOS ONE 15(12): e0242958.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42958 ↩
- N. Cohen et al., Diagnosing SARS-CoV-2 infection: the danger of over-reliance on positive test results, medRxiv 2020.04.26.20080911, https://doi.org/10.1101/2020.04.26.20080911 ↩